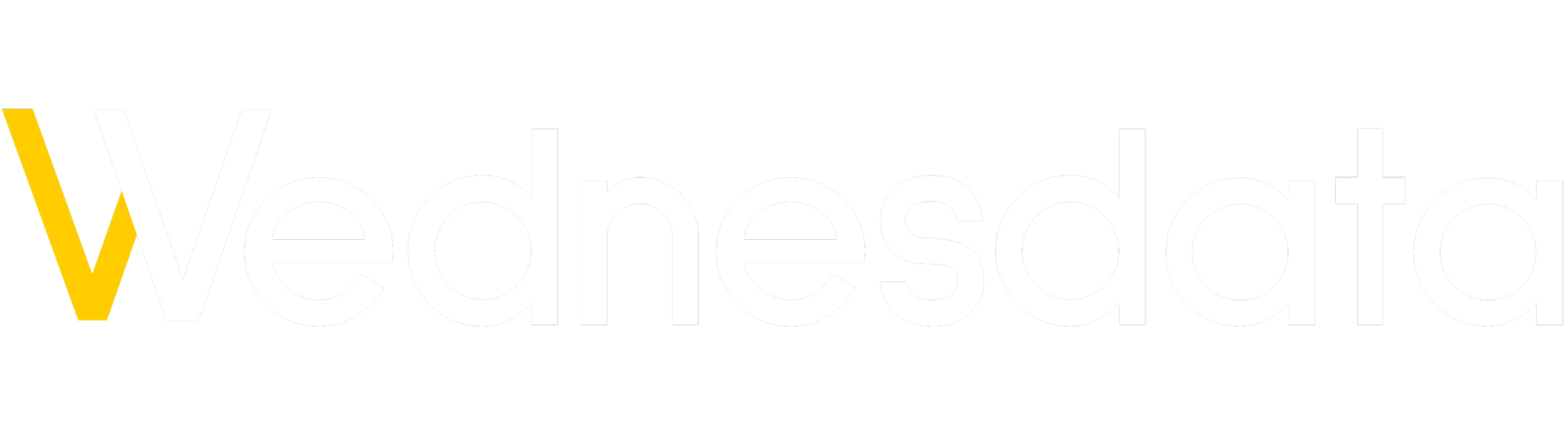녹아내리는 현금

요즘의 뉴스는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부동산, 주식, 금, 환율이 모두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 반면 통장 속 현금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대로인 것은 아닙니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현금이 녹아내린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이런 시기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흔들리는 현금
보통 특정 자산이 오를 땐 그 자산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주택은 수요와 공급, 주식은 실적과 기대감, 금은 안전자산 선호 같은 요인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흐름은 조금 다릅니다. 주식·부동산·금·환율이 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는 개별 자산의 호재가 아니라 ‘돈의 기준’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 모든 자산의 가격이 동시에 오릅니다. 1년 전보다 물가가 오르고 임금이 올랐어도 체감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현금’의 교환가치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글로벌 유동성 증가가 실질 자산가격 상승과 강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분석했습니다. 통화량이 늘면 그 돈은 결국 자산시장으로 흘러들고, 자산의 명목가치는 부풀어오릅니다. 즉, 지금의 자산 급등은 경기 호황이 아니라 ‘돈의 팽창’이 만든 착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돈의 팽창’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범람하는 현금
국내 자산 상승의 배경에는 세계적인 ‘유동성의 파도’가 있습니다. 미국·유럽·일본은 경기 둔화에 대응해 완화적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주요국 통화공급(M2)은 5년 전보다 평균 35% 이상 증가했습니다.

IMF와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선진국의 통화 공급이 늘어나면 약 3개월의 시차를 두고 신흥국 자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한국처럼 개방도가 높은 경제는 이런 파도의 영향을 더 빠르고 크게 받습니다.
결국 한국의 주식과 부동산 가격 상승은 단지 국내 요인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풀린 돈이 국경을 넘어 흘러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현금의 녹음’은 세계적 유동성 순환의 일부입니다.
이런 세계적 흐름 속에서 한국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을까요?
불안한 한국의 현금
10월 23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0%로 세 번째 동결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단기적으로 경기엔 도움이 되겠지만, 환율 불안과 자산시장 과열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결정은 신중함이라기보다 글로벌 통화 환경이 만들어낸 구조적 제약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계는 이미 금리의 시대를 지나, 양적완화(QE)의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과거에는 금리를 내리면 경기가 살아났지만, 더 이상 낮출 여지가 없자 각국은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도입된 ‘비상조치’는 이제 일상이 되었고, 그 돈을 다시 거둬들이는 일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돈의 양이 곧 경기의 기준이 된 지금, 금리의 효력은 예전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의 선택은 이런 세계적 흐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유동성의 파도 위에 올라타 있지만, 그 파도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이상, 금리를 마음대로 내릴 수도, 돈을 마음대로 찍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이번 금리 동결은 독립적인 결정이라기보다 세계적 유동성 구조 속에서 가능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달러가 움직이면 원화도 흔들리고, 세계의 금리가 멈추면 우리의 금리도 멈춥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기준금리 동결은 한국은행의 결정이기 전에 ‘원화(₩)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원화를 들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뭇거리는 현금, 그리고 우리
자산은 급등하고 원화는 불안한 지금, 우리는 끝없는 고민에 빠집니다. ‘지금 안 사면 늦는 건 아닐까?’, ‘나도 미국 주식을 해야 하나?’ 하지만 금융의 대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시장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하라.”
찰리 멍거 역시 “단기적 예측보다 장기적 원칙이 투자자의 생존을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사이클을 가지며, 급등 뒤에는 조정이 따릅니다. 단기 변동은 아무도 읽을 수 없지만, 장기적인 방향은 경제의 기본원리와 기업의 실적이 결정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 매월 일정 금액을 분할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 소비·저축·투자 비중을 스스로 정해두는 것.
- 금리와 환율, 물가의 변화를 꾸준히 관찰하는 것.
그런데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은 여전히 조급합니다. 누군가는 지금의 상승장을 ‘마지막 기회’로 느끼고, 누군가는 조정이 오면 ‘그때 잡아야지’라며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늘 같은 욕망이 있습니다. 빨리, 더 많이, 남들보다 앞서고 싶은 마음이죠. 우리는 모두 그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모여 시장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그 마음을 가장 비싼 값으로 사갑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돈의 흐름을 쫓기보다 나의 흐름을 다스리는 일, 조급함을 멈추는 순간 배움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 우리는 경제적 자유라는 환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함께 보기

우리는 ‘정리된 뉴스’가 아닌 ‘사유의 도구’를 전하고자 합니다. 웬즈데이터는 데이터 저널리즘이 단순한 시각화가 아닌, 복잡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믿습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수요일, 웬즈데이터와 함께하세요.
지금 구독하고, 데이터로 생각하는 사람의 목록에 합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