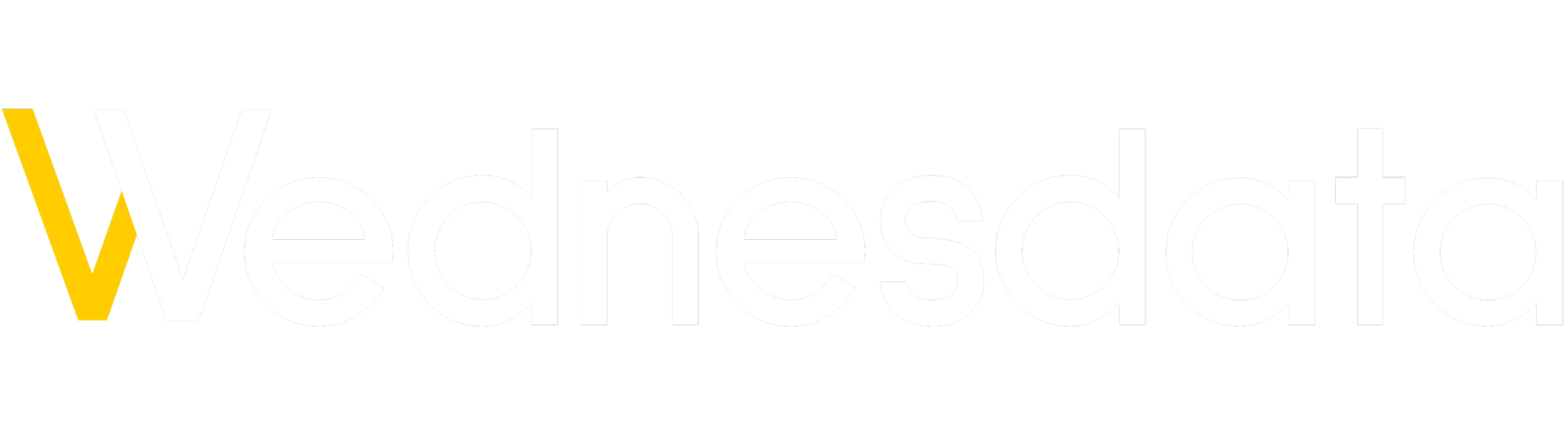왜 미국 기준금리는 '범위'일까?

한국의 기준금리는 하나의 숫자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 3.5%”처럼요. 그런데 미국은 다릅니다. 연방준비제도(Fed)는 “기준금리를 5.25%에서 5.50%로 유지했다”는 식으로 두 개의 숫자, 즉 범위로 발표합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미국은 기준금리를 단일 수치로 고정하기보다는,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금리가 자연스럽게 결정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목표로 삼는 금리는 은행들끼리 하루 동안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단기 금리인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입니다. 이 금리는 시장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연준은 특정 수치를 딱 정하는 대신 “이 정도 범위 안에서 움직이게 하겠다”는 식의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런 방식이 사용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장 자율성 유지
정부가 금리를 직접 통제하지 않고, 시장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금리를 결정하도록 유도합니다. - 운영의 유연성 확보
정해진 수치 하나보다 범위를 설정하면, 경기 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도 처음부터 이런 방식을 쓴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기준금리를 하나의 숫자로 발표했습니다. 지금처럼 범위로 운용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입니다. 당시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0%에 가깝게 낮췄고, 단일 수치만으로는 정책 여지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때 처음 “0.00~0.25%”처럼 범위로 제시하는 방식이 도입됐고, 이후 시장과의 소통 수단이자 정책 유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하나의 수치만 정할까요? 그건 금융시장 구조의 차이 때문입니다. 미국은 금융시장이 크고 복잡해서 시장 기반의 운용 방식이 잘 작동합니다. 반면 한국처럼 자금시장 규모가 작고 거래가 제한적인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명확한 기준금리를 제시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입니다.
결국 어떤 방식을 쓰느냐는 각국의 시장 구조와 정책 목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은 유연성과 자율성을, 한국은 명확성과 안정성을 선택한 셈입니다.